上代 日本語의 音韻體系: 萬葉假名의 借用音韻論
일본에서는 대개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에 나오는 만요가나를 하나로 뭉쳐서 연구한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세 텍스트 상호 간의 차이와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음운 변화를 놓치게 된다.
저자들은 만요가나로 기록된 가요를 『고사기』 가요, 『일본서기』 가요, 『만엽집』 가요의 셋으로 나누어 이들의 공시적 음운체계를 설정하되, 3종 텍스트의 음운체계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미세한 부분의 통시적 변화까지도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상대 일본어를 대상으로 음운사를 기술하는 데에 궁극적 목표를 두었다.
저자들은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의 분석 대상을 음가나로 한정하여 상대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재구했다. 이 3종의 텍스트에서 자음체계는 전혀 변동이 없지만, 모음체계는 텍스트별로 점진적 변화를 경험했다.
『고사기』에서는 기본모음 /a, i, u, e, o/에 을류 모음 /ə/가 더해진 6모음체계가 기본이되, G·B·M의 3행에서 제7의 모음 /ɨ/가 설정된다. 이 /ɨ/는 전기 중고음의 중뉴대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외래적 모음이다. 『일본서기』 음가나도 기본적으로 6모음체계이되, M행에서만 제7의 모음 /ɨ/가 설정된다. 『만엽집』 음가나에서도 G행에서 /ɨ/가 설정된다. 『만엽집』 음가나는 5모음체계가 기본이되, K·G·M의 3행에만 을류 모음 /ə/ 또는 /ɨ/가 설정된다.
상호 대비를 위하여 이들을 수치로 비유하면, ‘6.3모음>6.1모음>5.3모음>5.0모음’의 점진적 변화를 거쳐 9세기 4/4분기에 5모음체계가 확립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음체계가 ‘7모음>6모음>5모음’의 통시적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사기』 음가나는 7모음체계에서 6모음체계로 변화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일본서기』 음가나는 이 변화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이다. 『만엽집』 음가나는 6모음체계에서 5모음체계로 변화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상대 일본어의 8모음설은 “일본어학의 세계적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요 표기의 음가나로 한정하면 이 8모음설이 실증되지 않는다. 8모음설은 희귀 음가나뿐만 아니라 훈가나도 포함하고 모든 상대 일본어 자료를 한군데로 망라하여 분석할 때에만 성립하는 이론적 모음체계일 뿐이다.
일본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만엽가가 4,750여 수나 남아 있다. 기초적인 이본 연구부터 만엽인의 소리를 복원해 내는 일까지 연구의 목적·대상·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저자들은 그 깊고도 넓은 세계 중에서 표기법과 음운론 분야에 도전하여 8모음설을 무너뜨렸다.
저자들은 만요가나로 기록된 가요를 『고사기』 가요, 『일본서기』 가요, 『만엽집』 가요의 셋으로 나누어 이들의 공시적 음운체계를 설정하되, 3종 텍스트의 음운체계를 서로 대비함으로써 미세한 부분의 통시적 변화까지도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상대 일본어를 대상으로 음운사를 기술하는 데에 궁극적 목표를 두었다.
저자들은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의 분석 대상을 음가나로 한정하여 상대 일본어의 음운체계를 재구했다. 이 3종의 텍스트에서 자음체계는 전혀 변동이 없지만, 모음체계는 텍스트별로 점진적 변화를 경험했다.
『고사기』에서는 기본모음 /a, i, u, e, o/에 을류 모음 /ə/가 더해진 6모음체계가 기본이되, G·B·M의 3행에서 제7의 모음 /ɨ/가 설정된다. 이 /ɨ/는 전기 중고음의 중뉴대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외래적 모음이다. 『일본서기』 음가나도 기본적으로 6모음체계이되, M행에서만 제7의 모음 /ɨ/가 설정된다. 『만엽집』 음가나에서도 G행에서 /ɨ/가 설정된다. 『만엽집』 음가나는 5모음체계가 기본이되, K·G·M의 3행에만 을류 모음 /ə/ 또는 /ɨ/가 설정된다.
상호 대비를 위하여 이들을 수치로 비유하면, ‘6.3모음>6.1모음>5.3모음>5.0모음’의 점진적 변화를 거쳐 9세기 4/4분기에 5모음체계가 확립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음체계가 ‘7모음>6모음>5모음’의 통시적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고사기』 음가나는 7모음체계에서 6모음체계로 변화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일본서기』 음가나는 이 변화가 완성되기 바로 직전이다. 『만엽집』 음가나는 6모음체계에서 5모음체계로 변화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상대 일본어의 8모음설은 “일본어학의 세계적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가요 표기의 음가나로 한정하면 이 8모음설이 실증되지 않는다. 8모음설은 희귀 음가나뿐만 아니라 훈가나도 포함하고 모든 상대 일본어 자료를 한군데로 망라하여 분석할 때에만 성립하는 이론적 모음체계일 뿐이다.
일본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만엽가가 4,750여 수나 남아 있다. 기초적인 이본 연구부터 만엽인의 소리를 복원해 내는 일까지 연구의 목적·대상·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저자들은 그 깊고도 넓은 세계 중에서 표기법과 음운론 분야에 도전하여 8모음설을 무너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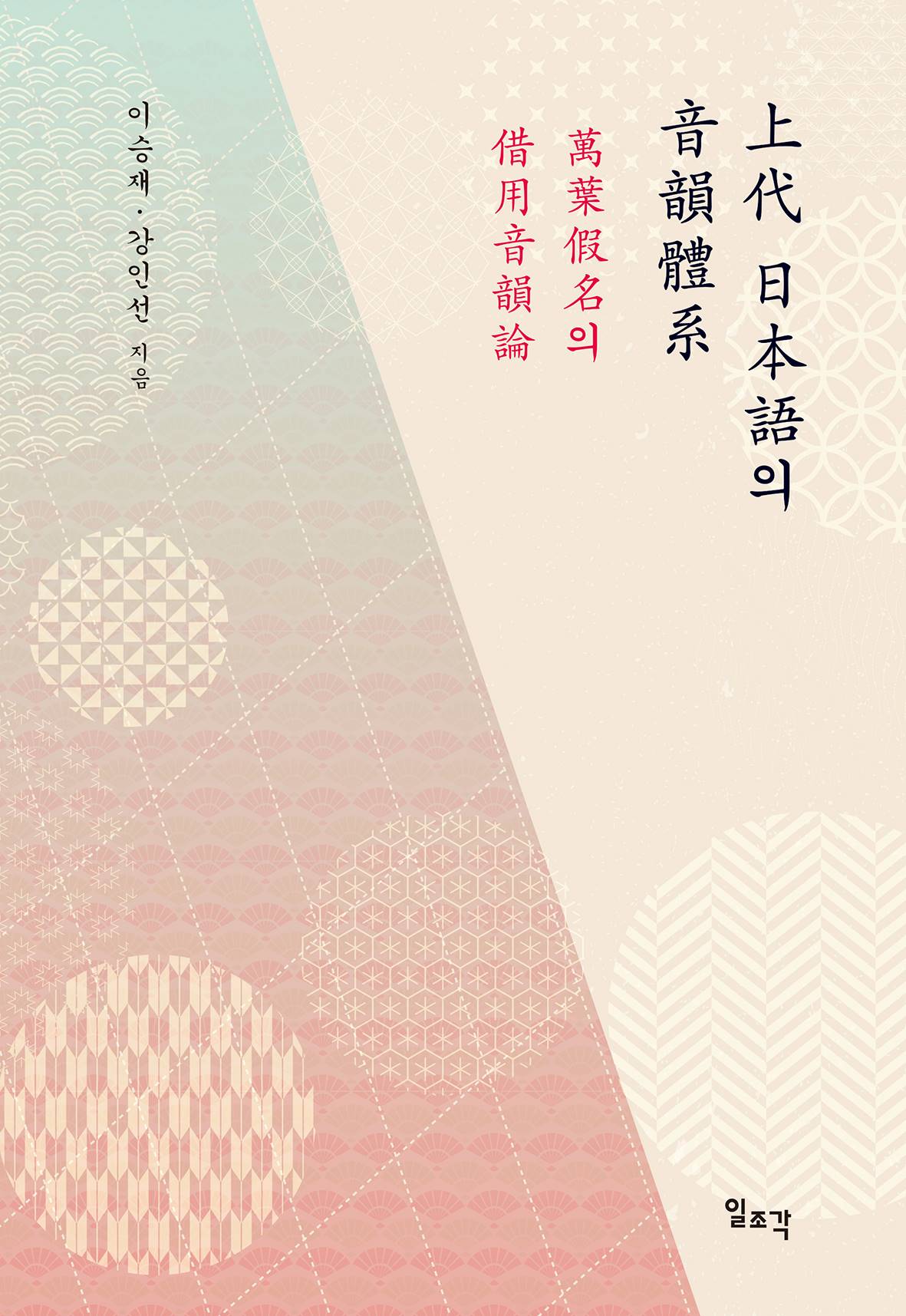
출판사
일조각
ISBN
978-89-337-0774-6 93700
출판된
2020
전문분야
인문학
주제
언어학
지역
동아시아
일본